작성자: sonslab | 발행일: 2025년 3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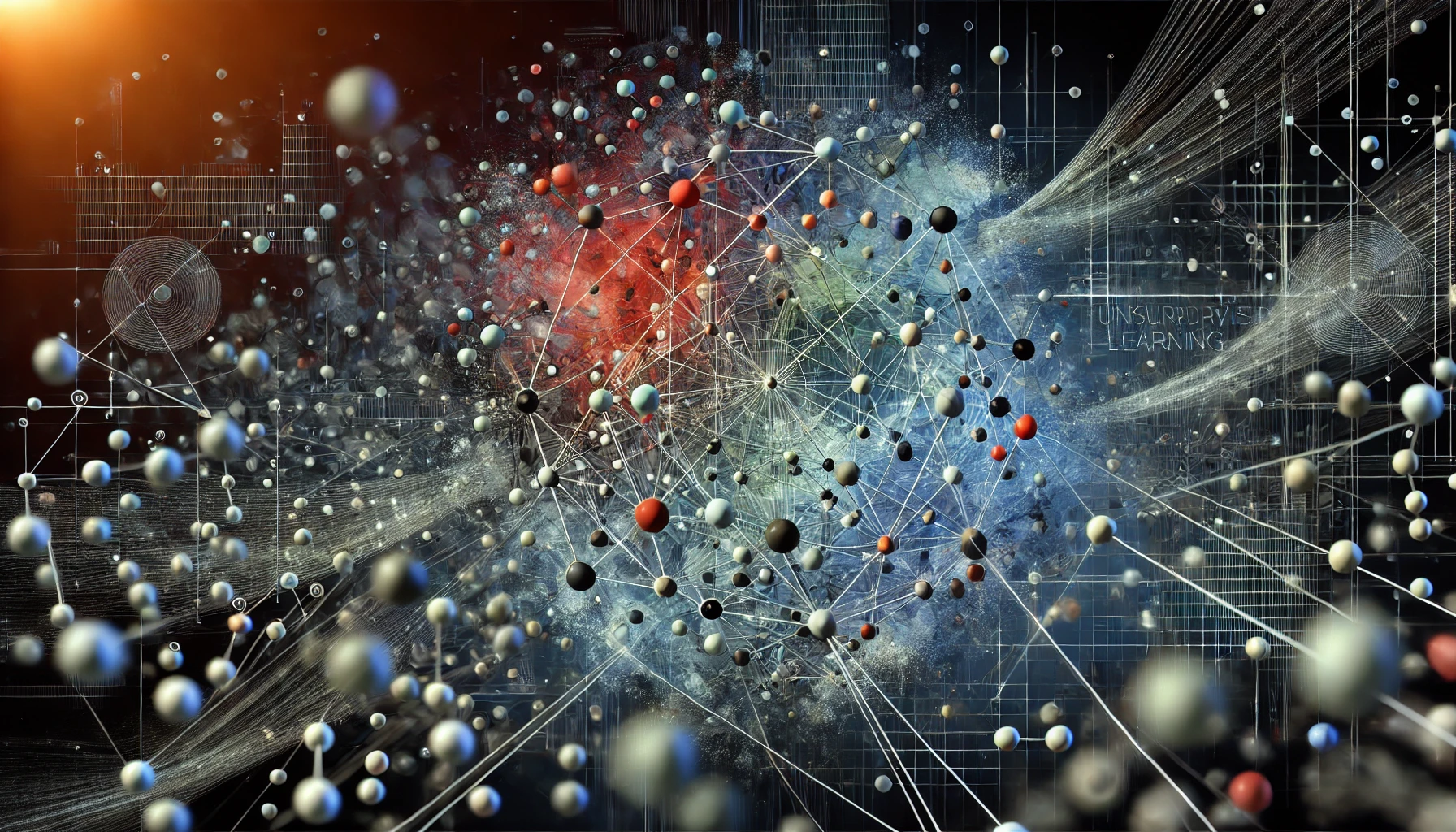
들어가며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1950년 논문 「계산 기계와 지능(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 기계가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고 학습하며,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명시적인 가르침 없이도 세상의 구조와 패턴을 자연스럽게 발견합니다. 아이가 별도의 지도 없이 색상을 구분하고, 모양을 인식하며, 소리의 패턴을 파악하는 과정은 경이롭습니다. 현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반도체 검사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며 전자 현미경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는 비지도학습의 놀라운 잠재력을 실감했습니다. 레이블이 없는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별자리를 찾아내는 고대 천문학자의 작업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지도학습의 근본적인 목적과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탐구하며, 기술적 메커니즘과 철학적 함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지도학습: 숨겨진 구조를 찾아서
목적: 왜 비지도학습인가?
비지도학습의 핵심 목적은 레이블이나 정답 없이 데이터의 내재적 구조와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로 세분화됩니다:
- 구조 발견(Structure Discovery): 데이터 내에 숨겨진 패턴, 관계, 규칙성을 파악합니다.
-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고차원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성을 보존하면서 저차원 표현을 찾습니다.
- 밀도 추정(Density Estimation): 데이터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합니다.
- 특성 학습(Feature Learning):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특성을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지식이 외부 세계의 무질서한 감각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인식하는 정신의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이러한 칸트의 인식론적 관점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현상(phenomena)'을 통해 그 기저의 '본질(noumena)'을 추론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 비지도학습은 어디에 활용되는가?
비지도학습의 응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네트워크 보안, 제조 품질 관리, 사기 거래 감지 등
-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s): 사용자 행동 패턴에 기반한 콘텐츠 추천
-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적 이해: 시각 데이터와 언어 데이터에서 의미 추출
- 데이터 전처리와 표현 학습: 지도학습을 위한 더 나은 데이터 표현 발견
- 고객 세분화(Customer Segmentation): 마케팅 전략을 위한 소비자 그룹 발견
반도체 산업에서는 비지도학습을 통해 생산 공정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결함 유형을 식별하며, 불량률을 예측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찾기 어려운 나노미터 수준의 패턴을 알고리즘이 발견하는 순간은 마치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처음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을 때의 경이로움과도 비슷합니다.
비지도학습의 주요 접근 방식
비지도학습은 다양한 알고리즘과 방법론을 통해 구현됩니다. 각 접근법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1. 군집화(Clustering): 유사성의 발견
군집화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유사성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인 K-means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를 최소화합니다:
$$J = \sum_{i=1}^{k} \sum_{x \in C_i} | x - \mu_i |^2$$
여기서 $\mu_i$는 클러스터 $C_i$의 중심점입니다.
K-means 외에도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 DBSCAN(밀도 기반 군집화),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각 방법은 데이터의 특성과 문제 영역에 따라 다른 강점을 가집니다.
군집화는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학적 접근과 유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을 특성에 따라 분류했듯이,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내재적 특성에 따라 범주화합니다.
2.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복잡성의 단순화
차원 축소는 고차원 데이터의 핵심 특성을 보존하면서 저차원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CA), t-SNE, UMAP 등이 있습니다.
PCA의 경우, $d$차원 데이터를 $k$차원($k < d$)으로 축소할 때, 다음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W_{opt} = \arg\max_W { \text{tr}(W^T X^T X W) }$$
여기서 $W$는 투영 행렬, $X$는 데이터 행렬입니다.
이 과정은 철학자 오컴(Occam)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정을 늘리지 말라"는 오컴의 면도날처럼, 차원 축소는 데이터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특성만을 유지합니다.
3. 표현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 데이터의 재해석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Learning)과 오토인코더(Autoencoder)는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오토인코더는 입력 $x$를 인코딩한 후 다시 디코딩하여 원본과 유사하게 재구성하는 네트워크입니다:
$$L(x, \hat{x}) = |x - \hat{x}|^2$$
여기서 $\hat{x} = g(f(x))$이며, $f$는 인코더, $g$는 디코더 함수입니다.
이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데이터)은 이데아(잠재 표현)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오토인코더는 이 그림자로부터 이데아를 유추하려는 시도입니다.
4. 생성 모델링(Generative Modeling): 데이터 분포의 이해
생성 모델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하여 새로운 샘플을 생성합니다. 변분 오토인코더(VAE)와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이 대표적입니다.
VAE는 다음과 같은 변분 하한(ELBO)을 최대화합니다:
$$\mathcal{L}(\theta, \phi; x) = \mathbb{E}{q\phi(z|x)}[\log p_\theta(x|z)] - D_{KL}(q_\phi(z|x) | p(z))$$
첫 번째 항은 재구성 정확도, 두 번째 항은 잠재 변수 분포가 사전 분포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측정합니다.
생성 모델링은 라이프니츠의 가능 세계 이론과 연결됩니다. 알고리즘이 학습한 잠재 공간에서의 각 지점은 데이터의 '가능한 버전'을 나타내며, 이는 현실 세계의 가능한 변형을 상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지도학습의 철학적 함의
비지도학습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인간의 지식과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패턴 인식: 선험적인가, 경험적인가?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지식 획득 방식과 유사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지식이 경험(후험적)과 선험적 범주 모두에 의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지도학습 알고리즘도 데이터(경험)로부터 학습하지만, 그 구조와 설계(선험적 가정)에 따라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K-means는 구형 클러스터를 찾는 경향이 있고, 오토인코더는 설계된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특정 패턴을 더 잘 포착합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인식론적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의 창발: 데이터에서 지식으로
철학자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에 따르면, 의미는 기호와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 그리고 해석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비지도학습은 데이터(기호)와 그 패턴(대상)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지만, 그 패턴의 '의미'는 여전히 인간 해석자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를 군집화했을 때 발견된 그룹이 "가격에 민감한 고객",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 등으로 해석되는 것은 알고리즘 자체가 아닌 인간의 해석을 통해서입니다.
불확실성과 해석의 다양성
비지도학습의 결과는 종종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는 과학철학자 퀸(W.V. Quine)의 '불확정성 테제'와 연결됩니다. 같은 데이터셋에 다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서로 다른, 때로는 모순되는 패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지식이 특정 이론적 프레임워크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퀸의 주장을 반영합니다.
비지도학습의 한계와 도전
비지도학습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여러 한계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 평가의 어려움
지도학습과 달리, 비지도학습은 분명한 '정답'이 없어 성능 평가가 어렵습니다. 내부 평가 지표(예: 실루엣 계수, 데이비스-볼딘 지수)와 외부 평가 지표(다른 작업에서의 성능)가 있지만, 각 지표는 특정 가정에 기반합니다.
2. 해석 가능성의 문제
비지도학습으로 발견된 패턴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거나 의미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견된 클러스터나 학습된 표현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산 복잡성과 확장성
많은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은 계산 비용이 높습니다. 특히 데이터 차원이 증가할수록 '차원의 저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래 방향: 인간과 기계의 협력적 학습
비지도학습의 미래는 인간의 직관과 알고리즘의 패턴 인식 능력이 시너지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비지도학습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간 피드백 통합: 비지도학습 결과에 대한 인간의 해석과 피드백을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인간 중심 AI' 접근법
- 다중 모달 학습: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모델
- 인과 관계 발견: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 구조를 학습하는 방법론
- 자기지도학습의 발전: 데이터 자체에서 지도 신호를 생성하는 보다 정교한 방법
나가며
비지도학습은 단순한 알고리즘적 접근을 넘어, 인간의 학습과 지식 획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이 과정은 과학자, 예술가, 철학자가 세계의 숨겨진 질서를 찾아내는 창조적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는 "질서와 연결은 사물 자체에 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이 내재된 질서를 발견하기 위한 인류의 지속적인 노력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비지도학습을 적용하며, 저는 종종 이러한 알고리즘이 발견하는 패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고대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통해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데이터의 바다에서 의미의 별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기술과 인문학,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입니다. 비지도학습은 그 여정에서 우리의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Sonslab은 현재 반도체 MI 분야에서 엔지니어들에게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 현미경 이미지를 계측 분석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DDCON에서 "자동화 시대의 AI와 인간의 협업 시너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인간 중심 AI 기술과, 응용 Application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도서를 준비 중입니다.
'2. 머신러닝 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화학습의 기본 원리와 요소: 경험을 통한 지능의 창발 (0) | 2025.03.28 |
|---|---|
| 데이터에서 지혜로: 지도학습의 핵심 개념과 작동 원리 (0) | 2025.03.26 |
| 머신러닝의 정의와 AI와의 관계: 지능의 스펙트럼을 탐색하다 (0) | 2025.03.25 |


